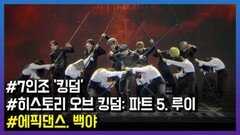복지국가 논쟁…진실은?
등록 2010.12.28.(구 가인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나라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평균 4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곧장 반박했는데요, 정치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우 기자, 한국을 복지국가로 볼 수 있습니까.
(우경임 기자) 내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것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양측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서로 한 쪽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을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복지 후발국으로서 빠르게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50년 동안 각종 생계보조 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이 빠르게 도입돼 전국민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2005년 50조8000억 원에서 내년도 86조3000억 원으로 35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6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 앵커)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해 한국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우 기자)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 위원은 정확한 사회복지 지출 비교를 위해 각 국가의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 대로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연금 가입자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국가간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1.8%로 OECD 평균 20.8%의 57% 수준이었습니다. 고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같은 북유럽국가의 49%이고 저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의 80% 수준입니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만 보면 한국을 복지국가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박 앵커)하지만 한국은 복지 예산을 늘려 북유럽형 복지로 가기는 어렵다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 기자) 실제로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조세 부담을 높여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대로 통일했을 때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20.3%로 OECD 평균의 73%입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사회복지지출이 43%나 적지만 세금은 27%만 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구 앵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나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같은 총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군요.
(우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조세 부담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 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다른 국가들이 처한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빈곤인구는 줄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납세 인구는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복지예산 총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래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과거 가족계획 사업 같은 보건 부문에 45%가 쏠려 있습니다. OECD는 평균 26.6%입니다. 반면 고령 가족 실업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후진국형 복지모델입니다. 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적은 예산으로도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복지국가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게 시급하군요. 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 제균 앵커) 내년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 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엔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구 가인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나라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평균 4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곧장 반박했는데요, 정치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우 기자, 한국을 복지국가로 볼 수 있습니까.
(우경임 기자) 내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것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양측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서로 한 쪽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을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복지 후발국으로서 빠르게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50년 동안 각종 생계보조 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이 빠르게 도입돼 전국민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2005년 50조8000억 원에서 내년도 86조3000억 원으로 35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6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 앵커) 다른 복지국가와 비교해 한국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우 기자)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 위원은 정확한 사회복지 지출 비교를 위해 각 국가의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 대로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연금 가입자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국가간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1.8%로 OECD 평균 20.8%의 57% 수준이었습니다. 고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같은 북유럽국가의 49%이고 저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의 80% 수준입니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만 보면 한국을 복지국가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박 앵커)하지만 한국은 복지 예산을 늘려 북유럽형 복지로 가기는 어렵다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 기자) 실제로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조세 부담을 높여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대로 통일했을 때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20.3%로 OECD 평균의 73%입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사회복지지출이 43%나 적지만 세금은 27%만 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구 앵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나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같은 총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군요.
(우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조세 부담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 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다른 국가들이 처한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빈곤인구는 줄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납세 인구는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복지예산 총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래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과거 가족계획 사업 같은 보건 부문에 45%가 쏠려 있습니다. OECD는 평균 26.6%입니다. 반면 고령 가족 실업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후진국형 복지모델입니다. 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적은 예산으로도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복지국가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게 시급하군요. 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재생02:122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재생02:122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A1/WPG2210274D/CA1_00000242358277.jpg) 재생08:44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재생08:44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재생02:364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재생02:364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01/B120230807/C01_D944135196.jpg) 재생03:525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재생03:525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재생04:00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재생04:00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01/B120180515/C01_D944359440.jpg) 재생01:467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재생01:467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재생06:138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재생06:138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P453766637/S01_470079977890.jpg)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재생04:4610아빠는 꽃중년둘째 환준에게 빼앗긴 아빠 성우의 관심, 그간 티도 못 내고 참았던 태오(ㅠㅠ)
재생04:4610아빠는 꽃중년둘째 환준에게 빼앗긴 아빠 성우의 관심, 그간 티도 못 내고 참았던 태오(ㅠㅠ)
![[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MK1/PR966/MK1_C1136588869.jpg)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01/B120230807/C01_D944135196.jpg)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P453766637/S01_470079977890.jpg)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VODA STUDIO
VODA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