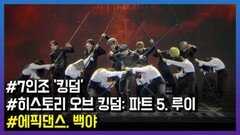속도에 배고픈 헝그리 웨이터 오늘도 달린다
등록 2013.09.26.CJ슈퍼레이스 슈퍼6000클래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승용(28·HSD SL모터스포츠·왼쪽)은 밤엔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고, 낮에는 카레이서로 변신하는 ‘헝그리 레이서’다. 올해 5월 전남 영암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1전에서 레이싱걸과 포즈를 취한 모습. 슈퍼레이스 제공보통 사람의 낮이 그에겐 밤이다. 그는 유흥업소 웨이터다. 그가 다니는 가게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다.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 새겨진 이름은 ‘이문세’다. 얼굴이 길다고 손님들이 붙여줬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삶과 이름이 있다. 카레이서 윤승용(28·HSD SL모터스포츠)이다. 배기량 6200cc짜리 머신이 그의 애마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과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의 양대 산맥인 CJ슈퍼레이스의 슈퍼6000클래스가 그가 뛰는 무대다. 국내 최대 배기량을 자랑하는 이 종목 드라이버는 10여 명밖에 안 된다. 맨손으로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그의 레이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헬멧을 쓴 폭주족
“야, 우리 폭주나 뛰러 가자.”
철없던 학생 시절 마음 맞는 친구 몇몇과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밤거리를 달렸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학교가 싫었고 무작정 자유롭고 싶었다. 밤거리를 달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폭주족들이 주로 모이던 여의도에 가면 또래들이 꽤 있었다.
돌이켜보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역주행, 칼치기(자동차 사이 비집고 다니기), 훌치기(S자로 차선 넘나들며 겁주기)를 했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 배달용 오토바이로 도로를 누볐다.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쳤다. 그는 “멋모를 때의 치기였다 해도 당시 놀라셨거나 피해를 입었던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어느 날 오토바이 동호회의 폼 나는 ‘라이딩’을 본 다음이었다. 멋진 슈트를 입고 줄지어 달려가는 동호회의 라이딩은 환상 그 자체였다.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해 그 동호회 정모(정기모임)를 찾아갔다.
20여 명 40여 개의 눈이 동시에 동그랗게 커졌다. 청바지 차림(나름대로 멋을 낸 거였다)의 10대 폭주족이 안장을 잔뜩 올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으니 왜 안 그랬겠는가.
잠시 동안 흐르던 침묵은 누군가의 목소리에 깨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오토바이를 원상복구 한 것이었다. 어떤 회원은 조용히 헬멧을 내밀었다. 그날 그는 난생처음 헬멧이란 걸 썼다.
○ 로케트를 이기다
“너, 경주 한 번 나가보지 않을래?”
고3이던 2003년 봄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식 오토바이 대회에 나가게 됐다. 어느 날 동호회 라이딩에서 125cc 액시브를 타고 1000cc급 레플리카(레이스용 바이크)를 따라잡았는데 이를 계기로 동호회원들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아는 회원이 폐차 직전의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낡은 오토바이였지만 첫 출전 대회에서 덜컥 4위를 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해 가을 혹독하게 훈련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이륜차 교육장에서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탔다. 커브를 돌다보면 슈트 무릎 부분에 넣는 보호대가 빨리 닳는다. 돈이 아까워 나무 조각을 무릎에 대고 테이프로 붙인 채 달렸다. 제3회 모토뱅크배 스쿠터 튜닝전이 열린 2004년 3월 28일은 그의 기억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당시 그 대회 챔피언 오토바이는 ‘로케트’였다. 일본에서 튜닝을 해 온 오토바이인데 비슷한 종류의 대회를 석권하고 있었다. 워낙 빨라 사람들이 ‘로케트’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날 그가 로케트를 이겨버렸다. 코너에선 그가 앞섰지만 직선 주로만 되면 로케트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왔다. 그는 “경기 파주에 있는 카트장을 20바퀴 돌았는데 마치 1년을 달린 것 같았다. 로케트를 이긴 뒤 엄청나게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한 번 1등을 하자 이후부터는 1등을 밥 먹 듯했다. 상금은 50만 원밖에 안 됐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한국 바이크 레이싱계의 1인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 우물 안 개구리
BMW S1000RR 오토바이를 몰고 서킷을 질주하는 윤승용. 윤승용 제공2005년 그는 처음 차를 샀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1992년식 스쿠프였다. 구입가는 50만 원이었다. 당시 경기 평택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퇴근 후면 차를 몰고 서울로 와 밤새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렸다. 그날도 새벽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멋지게 튜닝한 또 한 대의 스쿠프가 그를 앞질렀다. 그는 지고 싶지 않았다. 가속기를 밟았다. 야밤의 레이싱이 펼쳐졌다. 마침내 그가 추월에 성공했다.
상대편 운전자가 차를 세우더니 물었다 “어디 동호회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커피나 한잔하시죠.” 그는 그렇게 자동차 동호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레이서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 그가 카레이서로 처음 출전한 대회는 2006년 열린 스피드 페스티벌 클릭 챔피언스클래스였다. 첫 성적은 13위였다. 그는 “사실 엄청 충격을 먹었다. 난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했다. 그는 더욱 자신을 채찍질했다. 비싼 가격으로 빌려야 하는 서킷 대신 산길을 달리며 연습에 매진했다.
○ 낮엔 레이서, 밤엔 웨이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빨리 나왔다. 2007년 4월 그는 클릭 챔피언스클래스에서 처음 우승했다. 이듬해엔 넥센 RV 페스티벌 RS 150클래스에서 우승하는 등 카레이서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장 돈이 안 드는 레이스에 참가해도 출전비와 기름값, 타이어 비, 수리비 등을 내면 감당하기 힘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업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장이 쉬는 주말에는 서울에서 발레주차원으로 일했다. 1년 365일간 하루 2,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유흥업소 취직을 권했다. 돈도 돈이지만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다. 모은 돈은 고스란히 카레이싱을 하는 데 썼다. 2010년에는 KSF와 슈퍼레이스에 두루 출전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KSF와 슈퍼레이스에 나가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게 3등이다. 제일 낮은 등급에 출전했지만 역시 프로의 벽은 높았다. 무엇보다 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2011년부터 2년간 그는 카레이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 기간에는 돈이 크게 들지 않는 바이크 대회에만 출전했다.
○ 마지막 도전
“슈퍼6000이야. 한 번 타 보지 않을래?”
레이싱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올해 초 HSD SL모터스포츠 신영학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신 팀장이 슈퍼레이스 최고 등급의 레이서 자리를 권유한 것이다. 나이는 30세를 향해 가고 있었고, 벌어놓은 돈도 많지 않았다. 더구나 차를 타기 위해선 그나마 갖고 있는 돈도 쏟아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다. 그는 “슈퍼6000에 출전할 기회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10여 명에게만 주어진다.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7전까지 치른다. 경기를 치를 때마다 1위는 1300만 원, 2위 700만 원, 3위 4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5전까지 치른 25일 현재 그가 포디움(레이싱 경기 시상대)에 오른 것은 3전에서 3위를 한 게 유일하다. 하지만 매 경기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종합 포인트에서는 황진우(CJ레이싱), 김동은(인제스피디움)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다른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레이싱에만 집중할 때 그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며 차를 탔다. 몇몇 상위권 선수들은 현재 월급을 받으며 차를 타지만 그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참가비와 타이어, 기름, 정비사 비용 등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차를 탈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출전하는 슈퍼레이스 6전은 29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오후 4시. 눈을 뜬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 출근은 오후 5시까지지만 밤이 깊어진 후에야 일이 바빠진다. 손님들은 1차, 2차, 3차를 돌아 그의 가게에 온다. 술을 나르고, 안주를 나르고, 손님들의 기분을 나른다. 다음 날 오전 7시. 몸은 이미 천근만근. 잠이 쏟아지지만 참는다.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가게 근처 탄천으로 간다. 천천히 뛰기 시작한다. 뛰다 지치면 걷는다. 2시간을 돌아 집에 오니 오전 9시다. 밥을 먹고 꿈나라로 빠져든다. 》
CJ슈퍼레이스 슈퍼6000클래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승용(28·HSD SL모터스포츠·왼쪽)은 밤엔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고, 낮에는 카레이서로 변신하는 ‘헝그리 레이서’다. 올해 5월 전남 영암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1전에서 레이싱걸과 포즈를 취한 모습. 슈퍼레이스 제공보통 사람의 낮이 그에겐 밤이다. 그는 유흥업소 웨이터다. 그가 다니는 가게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다.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 새겨진 이름은 ‘이문세’다. 얼굴이 길다고 손님들이 붙여줬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삶과 이름이 있다. 카레이서 윤승용(28·HSD SL모터스포츠)이다. 배기량 6200cc짜리 머신이 그의 애마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과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의 양대 산맥인 CJ슈퍼레이스의 슈퍼6000클래스가 그가 뛰는 무대다. 국내 최대 배기량을 자랑하는 이 종목 드라이버는 10여 명밖에 안 된다. 맨손으로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그의 레이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헬멧을 쓴 폭주족
“야, 우리 폭주나 뛰러 가자.”
철없던 학생 시절 마음 맞는 친구 몇몇과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밤거리를 달렸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학교가 싫었고 무작정 자유롭고 싶었다. 밤거리를 달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폭주족들이 주로 모이던 여의도에 가면 또래들이 꽤 있었다.
돌이켜보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역주행, 칼치기(자동차 사이 비집고 다니기), 훌치기(S자로 차선 넘나들며 겁주기)를 했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 배달용 오토바이로 도로를 누볐다.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쳤다. 그는 “멋모를 때의 치기였다 해도 당시 놀라셨거나 피해를 입었던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어느 날 오토바이 동호회의 폼 나는 ‘라이딩’을 본 다음이었다. 멋진 슈트를 입고 줄지어 달려가는 동호회의 라이딩은 환상 그 자체였다.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해 그 동호회 정모(정기모임)를 찾아갔다.
20여 명 40여 개의 눈이 동시에 동그랗게 커졌다. 청바지 차림(나름대로 멋을 낸 거였다)의 10대 폭주족이 안장을 잔뜩 올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으니 왜 안 그랬겠는가.
잠시 동안 흐르던 침묵은 누군가의 목소리에 깨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오토바이를 원상복구 한 것이었다. 어떤 회원은 조용히 헬멧을 내밀었다. 그날 그는 난생처음 헬멧이란 걸 썼다.
○ 로케트를 이기다
“너, 경주 한 번 나가보지 않을래?”
고3이던 2003년 봄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식 오토바이 대회에 나가게 됐다. 어느 날 동호회 라이딩에서 125cc 액시브를 타고 1000cc급 레플리카(레이스용 바이크)를 따라잡았는데 이를 계기로 동호회원들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아는 회원이 폐차 직전의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낡은 오토바이였지만 첫 출전 대회에서 덜컥 4위를 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해 가을 혹독하게 훈련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이륜차 교육장에서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탔다. 커브를 돌다보면 슈트 무릎 부분에 넣는 보호대가 빨리 닳는다. 돈이 아까워 나무 조각을 무릎에 대고 테이프로 붙인 채 달렸다. 제3회 모토뱅크배 스쿠터 튜닝전이 열린 2004년 3월 28일은 그의 기억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당시 그 대회 챔피언 오토바이는 ‘로케트’였다. 일본에서 튜닝을 해 온 오토바이인데 비슷한 종류의 대회를 석권하고 있었다. 워낙 빨라 사람들이 ‘로케트’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날 그가 로케트를 이겨버렸다. 코너에선 그가 앞섰지만 직선 주로만 되면 로케트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왔다. 그는 “경기 파주에 있는 카트장을 20바퀴 돌았는데 마치 1년을 달린 것 같았다. 로케트를 이긴 뒤 엄청나게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한 번 1등을 하자 이후부터는 1등을 밥 먹 듯했다. 상금은 50만 원밖에 안 됐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한국 바이크 레이싱계의 1인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 우물 안 개구리
BMW S1000RR 오토바이를 몰고 서킷을 질주하는 윤승용. 윤승용 제공2005년 그는 처음 차를 샀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1992년식 스쿠프였다. 구입가는 50만 원이었다. 당시 경기 평택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퇴근 후면 차를 몰고 서울로 와 밤새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렸다. 그날도 새벽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멋지게 튜닝한 또 한 대의 스쿠프가 그를 앞질렀다. 그는 지고 싶지 않았다. 가속기를 밟았다. 야밤의 레이싱이 펼쳐졌다. 마침내 그가 추월에 성공했다.
상대편 운전자가 차를 세우더니 물었다 “어디 동호회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커피나 한잔하시죠.” 그는 그렇게 자동차 동호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레이서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 그가 카레이서로 처음 출전한 대회는 2006년 열린 스피드 페스티벌 클릭 챔피언스클래스였다. 첫 성적은 13위였다. 그는 “사실 엄청 충격을 먹었다. 난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했다. 그는 더욱 자신을 채찍질했다. 비싼 가격으로 빌려야 하는 서킷 대신 산길을 달리며 연습에 매진했다.
○ 낮엔 레이서, 밤엔 웨이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빨리 나왔다. 2007년 4월 그는 클릭 챔피언스클래스에서 처음 우승했다. 이듬해엔 넥센 RV 페스티벌 RS 150클래스에서 우승하는 등 카레이서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장 돈이 안 드는 레이스에 참가해도 출전비와 기름값, 타이어 비, 수리비 등을 내면 감당하기 힘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업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장이 쉬는 주말에는 서울에서 발레주차원으로 일했다. 1년 365일간 하루 2,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유흥업소 취직을 권했다. 돈도 돈이지만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다. 모은 돈은 고스란히 카레이싱을 하는 데 썼다. 2010년에는 KSF와 슈퍼레이스에 두루 출전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KSF와 슈퍼레이스에 나가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게 3등이다. 제일 낮은 등급에 출전했지만 역시 프로의 벽은 높았다. 무엇보다 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2011년부터 2년간 그는 카레이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 기간에는 돈이 크게 들지 않는 바이크 대회에만 출전했다.
○ 마지막 도전
“슈퍼6000이야. 한 번 타 보지 않을래?”
레이싱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올해 초 HSD SL모터스포츠 신영학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신 팀장이 슈퍼레이스 최고 등급의 레이서 자리를 권유한 것이다. 나이는 30세를 향해 가고 있었고, 벌어놓은 돈도 많지 않았다. 더구나 차를 타기 위해선 그나마 갖고 있는 돈도 쏟아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다. 그는 “슈퍼6000에 출전할 기회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10여 명에게만 주어진다.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7전까지 치른다. 경기를 치를 때마다 1위는 1300만 원, 2위 700만 원, 3위 4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5전까지 치른 25일 현재 그가 포디움(레이싱 경기 시상대)에 오른 것은 3전에서 3위를 한 게 유일하다. 하지만 매 경기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종합 포인트에서는 황진우(CJ레이싱), 김동은(인제스피디움)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다른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레이싱에만 집중할 때 그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며 차를 탔다. 몇몇 상위권 선수들은 현재 월급을 받으며 차를 타지만 그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참가비와 타이어, 기름, 정비사 비용 등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차를 탈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출전하는 슈퍼레이스 6전은 29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MK1/PR966/MK1_C1136588869.jpg)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재생03:542강력한 4팀박보람 부검 결과 밝혔다…소속사가 분노한 이유
재생03:542강력한 4팀박보람 부검 결과 밝혔다…소속사가 분노한 이유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재생03:37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비혼주의자 산다라박의 결혼 임박? 절친들에게 좋은 남자 찾는 법을 묻다!
재생03:374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비혼주의자 산다라박의 결혼 임박? 절친들에게 좋은 남자 찾는 법을 묻다! 재생07:205톡파원 25시자식을 잡아먹는 동상?! 이찬원 소름 쫙↗ 돋게 한 스위스 베른 분수 위 식인귀 | JTBC 240415 방송
재생07:205톡파원 25시자식을 잡아먹는 동상?! 이찬원 소름 쫙↗ 돋게 한 스위스 베른 분수 위 식인귀 | JTBC 240415 방송![[4월 21일 예고] ‘대상 공약’ 탁재훈, 김종국과 함께하는 지옥의 바디 프로필 도전기](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V2000009613/S01_470038214359.jpg) 재생00:566미운 우리 새끼[4월 21일 예고] ‘대상 공약’ 탁재훈, 김종국과 함께하는 지옥의 바디 프로필 도전기
재생00:566미운 우리 새끼[4월 21일 예고] ‘대상 공약’ 탁재훈, 김종국과 함께하는 지옥의 바디 프로필 도전기 재생03:307미운 우리 새끼“어? 괜찮은데...?!” 김승수, 20년 만의 스타일 변신 대성공
재생03:307미운 우리 새끼“어? 괜찮은데...?!” 김승수, 20년 만의 스타일 변신 대성공 재생02:108미운 우리 새끼“당장 계약서 가져와!!” 박영규, 시행사 직원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부동산 계약 체결
재생02:108미운 우리 새끼“당장 계약서 가져와!!” 박영규, 시행사 직원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부동산 계약 체결 재생03:21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자폐가 의심되니 병원에 가보세요" 배우 오윤아, 아들의 발달장애를 인정하기까지
재생03:21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자폐가 의심되니 병원에 가보세요" 배우 오윤아, 아들의 발달장애를 인정하기까지 재생02:4710눈물의 여왕//충격//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퀸즈그룹 회장 홍만대의 죽음! | tvN 240414 방송
재생02:4710눈물의 여왕//충격//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퀸즈그룹 회장 홍만대의 죽음! | tvN 240414 방송
 재생02:451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재생02:451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배고픔 주의]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고요? 진짜 옛날 즉떡이 나타났다! MBN 240405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MK1/PR967/MK1_C11362731000.jpg) 재생04:372전현무계획[배고픔 주의]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고요? 진짜 옛날 즉떡이 나타났다! MBN 240405 방송
재생04:372전현무계획[배고픔 주의]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고요? 진짜 옛날 즉떡이 나타났다! MBN 240405 방송 재생03:163올댓트로트니가 말해봐 (가수 황인선 M/V)
재생03:163올댓트로트니가 말해봐 (가수 황인선 M/V) 재생03:394아침마당초대가수 박서진의 ‘지나야’ | KBS 240410 방송
재생03:394아침마당초대가수 박서진의 ‘지나야’ | KBS 240410 방송 재생03:365꾸러기 식사교실편식하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407 방송
재생03:365꾸러기 식사교실편식하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407 방송 재생05:056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MBC 240408 방송
재생05:056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MBC 240408 방송 재생02:297꾸러기 식사교실편식하지 않는 도윤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407 방송
재생02:297꾸러기 식사교실편식하지 않는 도윤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407 방송 재생04:38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딸기, MBC 240408 방송
재생04:38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딸기, MBC 240408 방송 재생11:169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힘 모아 그려요, MBC 240408방송
재생11:169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힘 모아 그려요, MBC 240408방송![[구출 엔딩] 황정음, 메두사에 접속해 위험에 빠진 이준×윤태영 구출 성공!](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P468644073/S01_470021156143.jpg) 재생03:13107인의 부활[구출 엔딩] 황정음, 메두사에 접속해 위험에 빠진 이준×윤태영 구출 성공!
재생03:13107인의 부활[구출 엔딩] 황정음, 메두사에 접속해 위험에 빠진 이준×윤태영 구출 성공!

 VODA STUDIO
VODA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