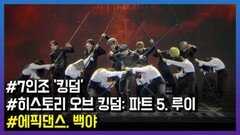4년만에 남북 이산상봉…“죽기전 너희들 보려고 왔다”
등록 2014.02.21.“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을 거요….”
감기 증세로 쓰러져 링거를 매단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던 김섬경 씨(91)는 단호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북한의 딸 춘순 씨(68)와 아들 진천 씨(65)를 반드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오전 그는 끝내 구급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북한의 아들딸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최근 척추 골절 수술을 받은 홍신자 씨(84)도 구급차를 타고 금강산에 도착했고 여동생 영옥 씨(82)와 조카 한광룡 씨(44)를 만나 하염없이 울었다. 김 씨와 홍 씨 모두 구급차 안에서 ‘비공개 상봉’을 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씨와 홍 씨는 건강상 우려가 너무 커 21일 오전 개별상봉을 마친 뒤 남측으로 조기 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급차를 이용한 김 씨와 홍 씨 외에 휠체어에 의지한 상봉자만 19명이었다. 한국 측 상봉자 82명 중 90세 이상이 25명(30.5%). 80대(42명)를 합치면 80세 이상은 81.7%에 달한다.
1972년 12월 납북된 오대양61호 선원 박양수 씨(55)가 한국에 사는 동생 양곤 씨(52)를, 1974년 2월 납북된 수원33호 선원 최영철 씨(61)가 형 선득 씨(71)를 만났다. 6·25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된 최병관 씨(68) 등 2명도 북한의 이복동생들을 만났다.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는 이날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만찬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63년 만에 만난 아내, 처음 본 아들
남자는 목에 뭐가 걸린 듯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10초의 침묵. 여자는 그런 남자를 담담히 바라봤다. 두 사람이 손을 다시 맞잡을 때까지 6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왜….
김영환 씨(90)는 20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전쟁통에 헤어진 아내 김명옥 씨(87)를 만났다. 긴 세월 탓일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비록 머리는 희어지고 얼굴은 주름졌지만 아내의 눈 속엔 60년 전 앳된 새색시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평남 강성군에 살았던 영환 씨는 1951년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하던 중 폭격을 피하려다 아내와 아들과 생이별했다. 다섯 살이었던 아들 김대성 씨(65)가 60대 노인이 되도록 이들은 만날 수 없었다. 영환 씨 내외는 이날 유일한 부부 상봉자였다. 하지만 난청으로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많이 늙었구나.”
90대 아버지가 생전 처음 본 60대 아들에게 건넨 첫마디. 강능환 씨(93)는 “한번 안아보자”며 아들 강정국 씨(63)를 힘주어 껴안았다. 1·4후퇴 때 강 씨는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에 두고 온 아내의 배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63년 만의 첫 만남이지만 그들이 ‘같은 핏줄’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굽은 등과 갸름한 얼굴.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능환 씨는 “아들 모습을 보니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정국 씨가 1971년 숨진 어머니 원순실 씨의 이름을 전하자 강 씨는 혼잣말로 “원순실, 원순실” 하고 되뇌었다.
○ 건강체크하며 맞아야 하는 ‘감격의 순간’
김용자 씨(68)는 북한에 사는 동생 김영실 씨(67)를 보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건넸다. 영실 씨가 “엄마”라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자, 용자 씨는 “지난해 9월에만 상봉이 이뤄졌어도 어머니를 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1951년 피란길에 나선 어머니 서정숙 씨와 용자 씨가 먼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아버지와 동생 영실 씨가 타려던 다음 배가 인민군의 폭격으로 부서졌다. 서 씨는 지난해 상봉자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북에 두고 온 딸을 본다는 기대감에 들떴다. 하지만 상봉은 연기됐고, 서 씨는 남북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던 이달 5일 지병으로 숨졌다.
이날 상봉자 대부분이 80, 90대 고령인 탓에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진 20여 명을 상봉장에 배치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박원숙 씨(82)가 전쟁 당시 행방불명됐던 여동생 박이숙 씨(79)를 만난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에 있던 대한적십자사 간호사가 즉각 다가가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우황청심환 복용을 권했다.
궂은 날씨에 건강마저 쇠약해져 이동용 간이침대에 누운 상봉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다. 최고령자인 김성윤 씨(96·여)는 여동생 김석려 씨(81)를 만나기 위해 요양원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다. 동생에게 줄 선물로 겨울옷도 미리 준비했다. 100세를 바라보는 성윤 씨는 사진을 보며 옛날 일을 모두 또렷이 기억해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4년만에 남북 이산상봉]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을 거요….”
감기 증세로 쓰러져 링거를 매단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던 김섬경 씨(91)는 단호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북한의 딸 춘순 씨(68)와 아들 진천 씨(65)를 반드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오전 그는 끝내 구급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북한의 아들딸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최근 척추 골절 수술을 받은 홍신자 씨(84)도 구급차를 타고 금강산에 도착했고 여동생 영옥 씨(82)와 조카 한광룡 씨(44)를 만나 하염없이 울었다. 김 씨와 홍 씨 모두 구급차 안에서 ‘비공개 상봉’을 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씨와 홍 씨는 건강상 우려가 너무 커 21일 오전 개별상봉을 마친 뒤 남측으로 조기 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급차를 이용한 김 씨와 홍 씨 외에 휠체어에 의지한 상봉자만 19명이었다. 한국 측 상봉자 82명 중 90세 이상이 25명(30.5%). 80대(42명)를 합치면 80세 이상은 81.7%에 달한다.
1972년 12월 납북된 오대양61호 선원 박양수 씨(55)가 한국에 사는 동생 양곤 씨(52)를, 1974년 2월 납북된 수원33호 선원 최영철 씨(61)가 형 선득 씨(71)를 만났다. 6·25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된 최병관 씨(68) 등 2명도 북한의 이복동생들을 만났다.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는 이날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만찬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63년 만에 만난 아내, 처음 본 아들
남자는 목에 뭐가 걸린 듯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10초의 침묵. 여자는 그런 남자를 담담히 바라봤다. 두 사람이 손을 다시 맞잡을 때까지 6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왜….
김영환 씨(90)는 20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전쟁통에 헤어진 아내 김명옥 씨(87)를 만났다. 긴 세월 탓일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비록 머리는 희어지고 얼굴은 주름졌지만 아내의 눈 속엔 60년 전 앳된 새색시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평남 강성군에 살았던 영환 씨는 1951년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하던 중 폭격을 피하려다 아내와 아들과 생이별했다. 다섯 살이었던 아들 김대성 씨(65)가 60대 노인이 되도록 이들은 만날 수 없었다. 영환 씨 내외는 이날 유일한 부부 상봉자였다. 하지만 난청으로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많이 늙었구나.”
90대 아버지가 생전 처음 본 60대 아들에게 건넨 첫마디. 강능환 씨(93)는 “한번 안아보자”며 아들 강정국 씨(63)를 힘주어 껴안았다. 1·4후퇴 때 강 씨는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에 두고 온 아내의 배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63년 만의 첫 만남이지만 그들이 ‘같은 핏줄’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굽은 등과 갸름한 얼굴.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능환 씨는 “아들 모습을 보니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정국 씨가 1971년 숨진 어머니 원순실 씨의 이름을 전하자 강 씨는 혼잣말로 “원순실, 원순실” 하고 되뇌었다.
○ 건강체크하며 맞아야 하는 ‘감격의 순간’
김용자 씨(68)는 북한에 사는 동생 김영실 씨(67)를 보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건넸다. 영실 씨가 “엄마”라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자, 용자 씨는 “지난해 9월에만 상봉이 이뤄졌어도 어머니를 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1951년 피란길에 나선 어머니 서정숙 씨와 용자 씨가 먼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아버지와 동생 영실 씨가 타려던 다음 배가 인민군의 폭격으로 부서졌다. 서 씨는 지난해 상봉자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북에 두고 온 딸을 본다는 기대감에 들떴다. 하지만 상봉은 연기됐고, 서 씨는 남북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던 이달 5일 지병으로 숨졌다.
이날 상봉자 대부분이 80, 90대 고령인 탓에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진 20여 명을 상봉장에 배치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박원숙 씨(82)가 전쟁 당시 행방불명됐던 여동생 박이숙 씨(79)를 만난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에 있던 대한적십자사 간호사가 즉각 다가가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우황청심환 복용을 권했다.
궂은 날씨에 건강마저 쇠약해져 이동용 간이침대에 누운 상봉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다. 최고령자인 김성윤 씨(96·여)는 여동생 김석려 씨(81)를 만나기 위해 요양원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다. 동생에게 줄 선물로 겨울옷도 미리 준비했다. 100세를 바라보는 성윤 씨는 사진을 보며 옛날 일을 모두 또렷이 기억해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재생03:291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재생03:291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재생07:522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재생07:522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재생03:423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재생03:423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재생12:58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형 빨리 돌아오세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2부)
재생12:58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형 빨리 돌아오세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2부) 재생01:2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재생01:2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재생01:466신발 벗고 돌싱포맨“없어요!” 임예진, 이상준의 닮은꼴 주장에 버럭↗
재생01:466신발 벗고 돌싱포맨“없어요!” 임예진, 이상준의 닮은꼴 주장에 버럭↗ 재생02:157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우진을 밀어내는 김하늘..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 KBS 240423 방송
재생02:157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우진을 밀어내는 김하늘..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 KBS 240423 방송 재생01:438선재 업고 튀어(의도 100%) 변우석, 김혜윤의 독서실 옆자리 차지 성공ㅎㅎ | tvN 240423 방송
재생01:438선재 업고 튀어(의도 100%) 변우석, 김혜윤의 독서실 옆자리 차지 성공ㅎㅎ | tvN 240423 방송 재생02:059수지맞은 우리신정윤의 부모님을 알게 된 함은정 | KBS 240423 방송
재생02:059수지맞은 우리신정윤의 부모님을 알게 된 함은정 | KBS 240423 방송 재생02:0610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재생02:0610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S1/C202400041/CS1_673821363.jpg)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재생03:488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재생03:488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S1/C202200194/CS1_673655935.jpg) 재생01:41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재생01:41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재생02:07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83년 전통 남한산성 맛집 갓 만들어 따뜻한 ‘순두부’ TV CHOSUN 240421 방송
재생02:07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83년 전통 남한산성 맛집 갓 만들어 따뜻한 ‘순두부’ TV CHOSUN 240421 방송

 VODA STUDIO
VODA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