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국문학을 거부합니다”
등록 2007.08.28.그런 강 교수가 16년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집약한 책 4권을 한꺼번에 냈다.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안쪽과 바깥쪽’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농암잡지평석’이다. 소명출판에서 나온 이 네 권의 책은 국문학과 실학의 기존 통념을 모두 부정한다. ‘국문학과 민족…’이 총론 격인 뿌리에 해당하고 3권은 이에 대한 논증의 가지들이다.
“1991년 민족과 근대에 천착한 이래 진창에 빠진 것처럼 더딘 황소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이들 책에서 기존 국문학의 길을 벗어났다. 민족이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개념에 정면으로 맞섰고, 실학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거센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미 그의 주장은 여러 차례 학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네 권의 책을 통해 강 교수는 하나의 결론을 내세운다. 그는 “순수와 우월을 전제한 민족 중심의 국문학사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일제강점기 식민주의에 맞서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어에 민족혼은 없으며 허균이나 박지원도 독창적 문장가가 아니다. 강 교수는 국어, 실학, 허균, 박지원이 오로지 민족의 내재적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현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76년 개항 이후에야 사용되기 시작한 ‘민족’은 같은 핏줄과 문화적 동질 집단이라는 허구적 개념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허균에서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근대문학의 맹아를 거쳐 근대를 이루는 위대한 문학사로 굳어진 ‘국문학사’도 부정한다. 수십 년의 국문학 연구는 허균의 문집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풍문만으로 그를 반(反)성리학적인 인간으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허균은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돼 고대(진한)의 산문을 전범으로 삼는 의고문(擬古文)파에 깊이 경도됐으며 독창성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연암 박지원의 사상도 서구식 근대적 사유가 아니라 의고문파를 비판하고 문학의 개성과 상대주의를 중시한 중국 공안(公安)파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타자 없이 주체 없고, 주체는 타자로 구성되는데 학계는 당시 중국이라는 타자에 주목하지 않았다”며 “연암의 사유는 당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이지 중세와 근대를 잇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강 교수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문학사의 주어 자리에 ‘민족’ 대신 ‘인간’을 넣자고 제안한다. 민족은 허구이지만 여성은 실재이므로 하나의 국문학사는 여러 갈래의 여성문학사나 양반문학사 등으로 나뉠 때 연구 토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강 교수의 연구는 당위의 허점을 들춰내고 반증해 얻은 귀납적 성과다. 그도 처음에는 민족과 근대를 믿었으나 1991년 서얼·평민의 ‘여항문학’을 연구하면서 근대나 민족 개념이 연구 결과와 모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국문학에 대한 신념과 스승을 부정하는 고단한 여정이 시작됐다. 강 교수는 “근대와 민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지 내내 갈등했고 때로 벗어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 가부장적 사유의 세뇌로 탄생한 열녀사, 조선 책벌레들의 이야기, 풍속사로 연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는 이미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와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통해 조선의 숨겨진 일면을 대중에게 전한 바 있다. 그는 “연구는 ‘평생 직업’이어서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강명관(49)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의 지향점은 기존 국문학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는 국문학이 전제하는 ‘민족’을 거부한다. 조선 후기를 ‘근대의 맹아기’로 보는 관점도 비판한다.
그런 강 교수가 16년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집약한 책 4권을 한꺼번에 냈다.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안쪽과 바깥쪽’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농암잡지평석’이다. 소명출판에서 나온 이 네 권의 책은 국문학과 실학의 기존 통념을 모두 부정한다. ‘국문학과 민족…’이 총론 격인 뿌리에 해당하고 3권은 이에 대한 논증의 가지들이다.
“1991년 민족과 근대에 천착한 이래 진창에 빠진 것처럼 더딘 황소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이들 책에서 기존 국문학의 길을 벗어났다. 민족이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개념에 정면으로 맞섰고, 실학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거센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미 그의 주장은 여러 차례 학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네 권의 책을 통해 강 교수는 하나의 결론을 내세운다. 그는 “순수와 우월을 전제한 민족 중심의 국문학사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일제강점기 식민주의에 맞서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어에 민족혼은 없으며 허균이나 박지원도 독창적 문장가가 아니다. 강 교수는 국어, 실학, 허균, 박지원이 오로지 민족의 내재적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현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76년 개항 이후에야 사용되기 시작한 ‘민족’은 같은 핏줄과 문화적 동질 집단이라는 허구적 개념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허균에서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근대문학의 맹아를 거쳐 근대를 이루는 위대한 문학사로 굳어진 ‘국문학사’도 부정한다. 수십 년의 국문학 연구는 허균의 문집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풍문만으로 그를 반(反)성리학적인 인간으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허균은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돼 고대(진한)의 산문을 전범으로 삼는 의고문(擬古文)파에 깊이 경도됐으며 독창성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연암 박지원의 사상도 서구식 근대적 사유가 아니라 의고문파를 비판하고 문학의 개성과 상대주의를 중시한 중국 공안(公安)파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타자 없이 주체 없고, 주체는 타자로 구성되는데 학계는 당시 중국이라는 타자에 주목하지 않았다”며 “연암의 사유는 당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이지 중세와 근대를 잇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강 교수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문학사의 주어 자리에 ‘민족’ 대신 ‘인간’을 넣자고 제안한다. 민족은 허구이지만 여성은 실재이므로 하나의 국문학사는 여러 갈래의 여성문학사나 양반문학사 등으로 나뉠 때 연구 토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강 교수의 연구는 당위의 허점을 들춰내고 반증해 얻은 귀납적 성과다. 그도 처음에는 민족과 근대를 믿었으나 1991년 서얼·평민의 ‘여항문학’을 연구하면서 근대나 민족 개념이 연구 결과와 모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국문학에 대한 신념과 스승을 부정하는 고단한 여정이 시작됐다. 강 교수는 “근대와 민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지 내내 갈등했고 때로 벗어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 가부장적 사유의 세뇌로 탄생한 열녀사, 조선 책벌레들의 이야기, 풍속사로 연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는 이미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와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통해 조선의 숨겨진 일면을 대중에게 전한 바 있다. 그는 “연구는 ‘평생 직업’이어서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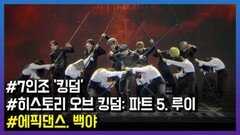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재생08:111야구여왕기선 제압 성공! 헛스윙 유도에 당해버리는 레이커스! 선발 투수 장수영이 해냈다
재생08:111야구여왕기선 제압 성공! 헛스윙 유도에 당해버리는 레이커스! 선발 투수 장수영이 해냈다 재생06:24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어느덧 일우의 삶에 깊게 자리잡은 선영... 오늘은 정말 고백하는 일우?
재생06:24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어느덧 일우의 삶에 깊게 자리잡은 선영... 오늘은 정말 고백하는 일우? 재생05:02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2025년 마지막 해돋이를 보러온 일영커플 2026년도 재밌게 지내는 걸로
재생05:02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2025년 마지막 해돋이를 보러온 일영커플 2026년도 재밌게 지내는 걸로 재생03:0542025 SBS 연예대상‘런닝맨’ 지예은, 여자 쇼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수상!
재생03:0542025 SBS 연예대상‘런닝맨’ 지예은, 여자 쇼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수상! 재생08:395야구여왕타자들의 강력한 방망이에 흐름 끊긴 레이커스! 블랙퀸즈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재생08:395야구여왕타자들의 강력한 방망이에 흐름 끊긴 레이커스! 블랙퀸즈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재생03:4262025 SBS 연기대상‘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 미니시리즈 멜로드라마 여자부문 최우수연기상 수상!
재생03:4262025 SBS 연기대상‘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 미니시리즈 멜로드라마 여자부문 최우수연기상 수상! 재생00:437한일슈퍼콘서트한일 트로트 올스타전_한일슈퍼콘서트 2회 예고 TV CHOSUN 251231 방송
재생00:437한일슈퍼콘서트한일 트로트 올스타전_한일슈퍼콘서트 2회 예고 TV CHOSUN 251231 방송![‘러브 호텔’ 김아영, 단막극상 [러브 : 트랙] 수상! | KBS 251231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496/K02_PS-2025218617-01-000_MFSC7678.jpg) 재생03:3882025 KBS 연기대상‘러브 호텔’ 김아영, 단막극상 [러브 : 트랙] 수상! | KBS 251231 방송
재생03:3882025 KBS 연기대상‘러브 호텔’ 김아영, 단막극상 [러브 : 트랙] 수상! | KBS 251231 방송 재생07:329야구여왕"한 번 더 믿어볼게!" 장수영의 잠재력을 기대하는 추신수! 선발 투수의 자리를 지켰다
재생07:329야구여왕"한 번 더 믿어볼게!" 장수영의 잠재력을 기대하는 추신수! 선발 투수의 자리를 지켰다 재생02:55102025 KBS 연기대상‘화려한 날들’ 정일우 장편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 | KBS 251231 방송
재생02:55102025 KBS 연기대상‘화려한 날들’ 정일우 장편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 | KBS 251231 방송
 재생01:201스타일 D정우성과 현빈이 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대 포인트
재생01:201스타일 D정우성과 현빈이 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대 포인트 재생01:012스타일 D메이드 인 코리아…‘현빈과 정우성’ 등 탄탄한 라인업
재생01:012스타일 D메이드 인 코리아…‘현빈과 정우성’ 등 탄탄한 라인업 재생03:433올댓트로트이불…맞장구 Song by 옥이(2024년 10월 16일 발매)
재생03:433올댓트로트이불…맞장구 Song by 옥이(2024년 10월 16일 발매) 재생03:064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
재생03:064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8-01-000_MFSC12436.jpg) 재생04:195화려한 날들"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04:195화려한 날들"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23:306낚시TV핼다람수심 90미터! 심해에서 드디어 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생23:306낚시TV핼다람수심 90미터! 심해에서 드디어 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생05:037탐정들의 영업비밀야망남 전민기! 아내 정미녀의 인기를 누르기 위해 탐비에 출동했다?!
재생05:037탐정들의 영업비밀야망남 전민기! 아내 정미녀의 인기를 누르기 위해 탐비에 출동했다?! 재생07:418탐정들의 영업비밀고향으로 내려간 후부터 끊긴 연락 수단?! 꾸준하던 SNS 업로드도 끊겼다! 커져만 가는 의뢰인의 걱정
재생07:418탐정들의 영업비밀고향으로 내려간 후부터 끊긴 연락 수단?! 꾸준하던 SNS 업로드도 끊겼다! 커져만 가는 의뢰인의 걱정![[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8-01-000_MFSC14581.jpg) 재생09:039화려한 날들[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09:039화려한 날들[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12:5010야구플러스2025시즌 최고의 유격수는 누구일까?
재생12:5010야구플러스2025시즌 최고의 유격수는 누구일까?

 VODA STUDIO
VODA STU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