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농구스타 김영희 “뇌종양, 거인병, 수없이 하늘 원망했지만…”
등록 2014.09.15.2m가 넘는 키로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던 그를 추석 다음 날인 9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자택에서 만났다. 다세대주택 2층의 20m²(약 6평) 단칸방에서 마주한 김 씨는 거동이 불편했다. 올해 초 장(腸)마비 증세와 폐에 물이 차고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쓰러져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2개월여 동안 입원했던 후유증이 남은 것이다. 합병증으로 윗니도 몇 개 없었다. 그는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느냐. 집에서 보자고 해 미안하다”며 신문지 크기만 한 상에 송편과 포도 한 송이를 차렸다. 매년 명절을 혼자 보내다 손님은 기자가 처음이라고 했다. 소파와 싱크대로 채워진 공간의 한쪽 벽에 놓인 장식장에는 녹슨 훈장, 트로피와 함께 코끼리 인형들이 눈길을 끌었다.
○ 너무 작게 태어났지만…
김 씨는 아기 때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할머니가 백일기도를 했다고 하더라. 아버지(165cm)와 어머니(163cm)도 크지 않았다.”
그러던 그의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것은 다섯 살 때부터. “(부산 석포) 초등학교 입학식 날엔 맨 뒤에 설 정도가 되더니 5학년 때 175cm가 넘었다. 학교에서 나 때문에 배구팀을 만들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중단하고 상경해 1년 동안 실업 배구팀에서 생활했다. 아버지가 결핵으로 요양 중이라 어머니는 생선 행상을 했다. 밥 구경도 못하다 서울 와 배불리 먹으니 키가 187cm까지 크더라.”
농구와 배구장을 전전하던 그는 부산 동주여중 농구부 시절 일찌감치 실업팀 한국화장품과 전속 계약을 했다. 박찬숙에 맞설 대항마로 ‘영희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줄 알았다.
○ 큰 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1981년 서울 숭의여고 졸업 후 한국화장품에 입단한 김영희는 대회 엠블럼에 코끼리 그림이 들어간 점보시리즈가 출범하면서 한껏 주목받았다. 당시 한 경기 최다인 52점을 넣으며 개인 타이틀 5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에 발목이 잡혔다. 3점슛 제도 도입으로 농구 전술이 바뀐 것도 악재였다. “경기에 지면 모든 게 내 탓이었다. 대표팀에서도 벤치에 자주 앉아있었다.” 빙하기를 맞은 공룡 신세였던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다 돌연 은퇴식도 없이 코트를 떠났다.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코끼리처럼 그날을 떠올리던 김 씨는 몸서리를 쳤다.
“1987년 11월이었다. 샤워할 때 머리에 감각이 없더라. 두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 뇌종양이라더라. 이틀만 늦게 갔어도 위독할 뻔했다. 스물다섯 살 때였다.”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다. 1998년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가 59세로 세상을 떠난 뒤 2000년 아버지마저 세 차례의 암 수술 끝에 눈을 감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7개월 가까이 곡기를 끊었다. 130kg 나가던 체중이 70kg까지 빠지더라.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2002년 거인병으로 알려진 말단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그의 키가 현역 때보다 커진 205cm에 이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심장과 장기 등이 계속 커져 죽게 되는 병이다. 매달 150만 원 넘게 드는 성장호르몬 억제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한다. 다행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에서 계속 도와주고 계시다. 나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힘들게 하는지. 하늘을 수도 없이 원망했다.”
○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꺽다리 아줌마
김 씨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낯선 시선도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장군감’이라고 말하던 동네 어른들을 피하려고 멀리 돌아다녔다. 처음 부천에 이사 와서는 아이들이 집 앞에 몰려와 ‘거인 나오라’고 외쳐댔다.” 4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출도 꺼렸던 김 씨의 마음을 잡게 한 건 어느 날 불쑥 떠오른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엄마 아빠 다 죽고 너 혼자 되면 남에게 먼저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힘들어도 누군가를 부축하고 일으켜야 너도 살 수 있다’면서 말이다.”
기초연금과 메달포상 연금 등으로 매달 50만 원가량을 손에 쥐는 김 씨는 면도날 끼우기, 양말 실밥 제거 등 가내 부업으로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을 도왔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쌀 같은 구호품 등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
“장애인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몸이 불편해 양말도 혼자 못 신는 분들을 보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홀몸노인들에게 팥죽을 끓여 주기도 하고 나를 놀리던 꼬마들에게는 과자와 사탕을 건넸다.” 김 씨는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최근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관심이 집중된 전 프로농구 코치 박승일 씨 얘기도 꺼냈다. “언젠가 승일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몸이 부쩍 마르셨더라. 아들 생각해서 밥이 안 넘어가도 많이 드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장애 5급인데 3급만 되어도 그에게 큰 힘이 될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제 김 씨는 주변 사람의 농담도 웃으며 받아넘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어떤 어르신이 내 신발(330mm)을 보더니 항공모함 같다고 하길래 ‘내 신발 한번 타고 노를 저어 유럽 여행 가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큰 과일은 싱겁고 푸석푸석하지 않으냐. 내가 사람은 커도 마음은 솜사탕 같다. 아무 꿈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농구 후배들이 많이 도와줬다. 언젠가 농구장 가서 치어리더라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다 코트 무너지면 어떡하지. 호호.” 김 씨가 몇 개 안 남은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보름달처럼 환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이름보다 ‘코끼리’라는 별명이 더 유명했다. 1980년대 농구 코트를 호령했던 김영희 씨(52)다. 1982년 인도 뉴델리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멤버였다.
2m가 넘는 키로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던 그를 추석 다음 날인 9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자택에서 만났다. 다세대주택 2층의 20m²(약 6평) 단칸방에서 마주한 김 씨는 거동이 불편했다. 올해 초 장(腸)마비 증세와 폐에 물이 차고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쓰러져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2개월여 동안 입원했던 후유증이 남은 것이다. 합병증으로 윗니도 몇 개 없었다. 그는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느냐. 집에서 보자고 해 미안하다”며 신문지 크기만 한 상에 송편과 포도 한 송이를 차렸다. 매년 명절을 혼자 보내다 손님은 기자가 처음이라고 했다. 소파와 싱크대로 채워진 공간의 한쪽 벽에 놓인 장식장에는 녹슨 훈장, 트로피와 함께 코끼리 인형들이 눈길을 끌었다.
○ 너무 작게 태어났지만…
김 씨는 아기 때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할머니가 백일기도를 했다고 하더라. 아버지(165cm)와 어머니(163cm)도 크지 않았다.”
그러던 그의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것은 다섯 살 때부터. “(부산 석포) 초등학교 입학식 날엔 맨 뒤에 설 정도가 되더니 5학년 때 175cm가 넘었다. 학교에서 나 때문에 배구팀을 만들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중단하고 상경해 1년 동안 실업 배구팀에서 생활했다. 아버지가 결핵으로 요양 중이라 어머니는 생선 행상을 했다. 밥 구경도 못하다 서울 와 배불리 먹으니 키가 187cm까지 크더라.”
농구와 배구장을 전전하던 그는 부산 동주여중 농구부 시절 일찌감치 실업팀 한국화장품과 전속 계약을 했다. 박찬숙에 맞설 대항마로 ‘영희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줄 알았다.
○ 큰 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1981년 서울 숭의여고 졸업 후 한국화장품에 입단한 김영희는 대회 엠블럼에 코끼리 그림이 들어간 점보시리즈가 출범하면서 한껏 주목받았다. 당시 한 경기 최다인 52점을 넣으며 개인 타이틀 5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에 발목이 잡혔다. 3점슛 제도 도입으로 농구 전술이 바뀐 것도 악재였다. “경기에 지면 모든 게 내 탓이었다. 대표팀에서도 벤치에 자주 앉아있었다.” 빙하기를 맞은 공룡 신세였던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다 돌연 은퇴식도 없이 코트를 떠났다.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코끼리처럼 그날을 떠올리던 김 씨는 몸서리를 쳤다.
“1987년 11월이었다. 샤워할 때 머리에 감각이 없더라. 두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 뇌종양이라더라. 이틀만 늦게 갔어도 위독할 뻔했다. 스물다섯 살 때였다.”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다. 1998년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가 59세로 세상을 떠난 뒤 2000년 아버지마저 세 차례의 암 수술 끝에 눈을 감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7개월 가까이 곡기를 끊었다. 130kg 나가던 체중이 70kg까지 빠지더라.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2002년 거인병으로 알려진 말단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그의 키가 현역 때보다 커진 205cm에 이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심장과 장기 등이 계속 커져 죽게 되는 병이다. 매달 150만 원 넘게 드는 성장호르몬 억제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한다. 다행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에서 계속 도와주고 계시다. 나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힘들게 하는지. 하늘을 수도 없이 원망했다.”
○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꺽다리 아줌마
김 씨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낯선 시선도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장군감’이라고 말하던 동네 어른들을 피하려고 멀리 돌아다녔다. 처음 부천에 이사 와서는 아이들이 집 앞에 몰려와 ‘거인 나오라’고 외쳐댔다.” 4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출도 꺼렸던 김 씨의 마음을 잡게 한 건 어느 날 불쑥 떠오른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엄마 아빠 다 죽고 너 혼자 되면 남에게 먼저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힘들어도 누군가를 부축하고 일으켜야 너도 살 수 있다’면서 말이다.”
기초연금과 메달포상 연금 등으로 매달 50만 원가량을 손에 쥐는 김 씨는 면도날 끼우기, 양말 실밥 제거 등 가내 부업으로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을 도왔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쌀 같은 구호품 등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
“장애인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몸이 불편해 양말도 혼자 못 신는 분들을 보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홀몸노인들에게 팥죽을 끓여 주기도 하고 나를 놀리던 꼬마들에게는 과자와 사탕을 건넸다.” 김 씨는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최근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관심이 집중된 전 프로농구 코치 박승일 씨 얘기도 꺼냈다. “언젠가 승일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몸이 부쩍 마르셨더라. 아들 생각해서 밥이 안 넘어가도 많이 드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장애 5급인데 3급만 되어도 그에게 큰 힘이 될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제 김 씨는 주변 사람의 농담도 웃으며 받아넘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어떤 어르신이 내 신발(330mm)을 보더니 항공모함 같다고 하길래 ‘내 신발 한번 타고 노를 저어 유럽 여행 가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큰 과일은 싱겁고 푸석푸석하지 않으냐. 내가 사람은 커도 마음은 솜사탕 같다. 아무 꿈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농구 후배들이 많이 도와줬다. 언젠가 농구장 가서 치어리더라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다 코트 무너지면 어떡하지. 호호.” 김 씨가 몇 개 안 남은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보름달처럼 환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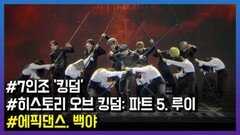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재생03:431올댓트로트이불…맞장구 Song by 옥이(2024년 10월 16일 발매)
재생03:431올댓트로트이불…맞장구 Song by 옥이(2024년 10월 16일 발매)!["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8-01-000_MFSC12436.jpg) 재생04:192화려한 날들"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04:192화려한 날들"천생연분인가 보다"계단에서 정인선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8-01-000_MFSC14581.jpg) 재생09:033화려한 날들[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09:033화려한 날들[42화 하이라이트] "좋으면서..."밥을 먹자는 정인선의 제안에 천호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일우 [화려한 날들] | KBS 251228 방송 재생01:014스타일 D메이드 인 코리아…‘현빈과 정우성’ 등 탄탄한 라인업
재생01:014스타일 D메이드 인 코리아…‘현빈과 정우성’ 등 탄탄한 라인업 재생01:205스타일 D정우성과 현빈이 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대 포인트
재생01:205스타일 D정우성과 현빈이 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대 포인트 재생23:306낚시TV핼다람수심 90미터! 심해에서 드디어 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생23:306낚시TV핼다람수심 90미터! 심해에서 드디어 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생03:067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
재생03:067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 재생12:508야구플러스2025시즌 최고의 유격수는 누구일까?
재생12:508야구플러스2025시즌 최고의 유격수는 누구일까?![[선공개] 모태솔로 심권호의 첫번째 연애수업, 여자와 단둘이 장보기 도전? TV CHOSUN 251229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CS1/C202200194/CS1_706103399.jpg) 재생01:35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모태솔로 심권호의 첫번째 연애수업, 여자와 단둘이 장보기 도전? TV CHOSUN 251229 방송
재생01:35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모태솔로 심권호의 첫번째 연애수업, 여자와 단둘이 장보기 도전? TV CHOSUN 251229 방송![[1월 4일 예고] “백마 띠예요!” 수영, 말의 해 맞이하며 런닝맨 멤버들과 빙고판 정복↗](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V0000330171/S01_477498884524.jpg) 재생00:5010런닝맨[1월 4일 예고] “백마 띠예요!” 수영, 말의 해 맞이하며 런닝맨 멤버들과 빙고판 정복↗
재생00:5010런닝맨[1월 4일 예고] “백마 띠예요!” 수영, 말의 해 맞이하며 런닝맨 멤버들과 빙고판 정복↗
 재생03:061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
재생03:061나 혼자 산다입양 동의서 작성 완료 다른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기안84, MBC 251226 방송!["아버지, 저는 독립합니다"침대 위에 박성근에게 쓴 편지를 두고 가출한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7-01-000_MFSC5983.jpg) 재생02:032화려한 날들"아버지, 저는 독립합니다"침대 위에 박성근에게 쓴 편지를 두고 가출한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
재생02:032화려한 날들"아버지, 저는 독립합니다"침대 위에 박성근에게 쓴 편지를 두고 가출한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아버지한테 고자질할 생각부터 해?"사실을 말하려는 윤현민을 말리는 이태란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7-01-000_MFSC4763.jpg) 재생02:553화려한 날들"아버지한테 고자질할 생각부터 해?"사실을 말하려는 윤현민을 말리는 이태란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
재생02:553화려한 날들"아버지한테 고자질할 생각부터 해?"사실을 말하려는 윤현민을 말리는 이태란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 재생59:274KNN뉴스"파면됐지만 전 대통령인데.." 윤석열 1시간 열변에 재판부 ′칼차단′ /KNN
재생59:274KNN뉴스"파면됐지만 전 대통령인데.." 윤석열 1시간 열변에 재판부 ′칼차단′ /KNN 재생05:55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더블 김장 데이트 끝! 김치, 보쌈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김장 한 상 차림 완성
재생05:55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더블 김장 데이트 끝! 김치, 보쌈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김장 한 상 차림 완성!["경찰에 신고할 거예요"자신의 뺨을 때리는 박성근에게 따져 묻는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2/T2025-0159/K02_PS-2025195977-01-000_MFSC10820.jpg) 재생03:276화려한 날들"경찰에 신고할 거예요"자신의 뺨을 때리는 박성근에게 따져 묻는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
재생03:276화려한 날들"경찰에 신고할 거예요"자신의 뺨을 때리는 박성근에게 따져 묻는 박정연 [화려한 날들] | KBS 251227 방송![[1월 2일 예고] 이서진×김광규, ‘자유부인’ 이현이×이지혜×이은형 위해 공동 육아↗](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S01/P475968154/S01_477485306890.jpg) 재생01:137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1월 2일 예고] 이서진×김광규, ‘자유부인’ 이현이×이지혜×이은형 위해 공동 육아↗
재생01:137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1월 2일 예고] 이서진×김광규, ‘자유부인’ 이현이×이지혜×이은형 위해 공동 육아↗ 재생01:138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진짜 짜증 난다!” 한지민, 이서진이 촬영한 사진 비율에 불만 폭주
재생01:138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진짜 짜증 난다!” 한지민, 이서진이 촬영한 사진 비율에 불만 폭주!["웃겨 정말, 언감생심" 류진을 사윗감으로? 웃긴 정애리 [마리와 별난 아빠들] | KBS 251226 방송](https://dimg.donga.com/a/240/135/90/3/egc/CDB/VODA/Article/K01/T2025-0296/K01_PS-2025229169-01-000_MFSC2669.jpg) 재생02:369마리와 별난 아빠들"웃겨 정말, 언감생심" 류진을 사윗감으로? 웃긴 정애리 [마리와 별난 아빠들] | KBS 251226 방송
재생02:369마리와 별난 아빠들"웃겨 정말, 언감생심" 류진을 사윗감으로? 웃긴 정애리 [마리와 별난 아빠들] | KBS 251226 방송 재생04:49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소윤을 위해 성수가 직접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는 커플(?) 목도리?!
재생04:49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소윤을 위해 성수가 직접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는 커플(?) 목도리?!

 VODA STUDIO
VODA STUDIO







